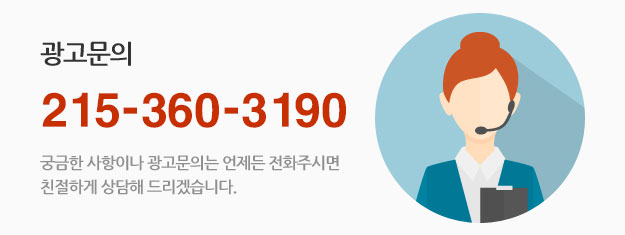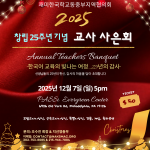[부모 솔루션: 우리 아이 왜 이럴까요? (291)]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동은 집에서는 말을 잘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입을 다무는 편이다.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아동은 알고 보면 말을 못하는 아동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즉 여러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이다. 이런 아동은 말보다는 대인공포감이라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 서둘러 개선해 주어야 한다.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아동,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아동, 말하기를 회피하는 아동이다.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은 다음 특징이 있다.
1. 불안을 자주 경험한 결과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은 불안을 자주 경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불안이 축적되어 해소되지 못해서 두려움으로까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불안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생물학적 측면을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다. 생물학적 측면이란 뇌와 관련된 작용이나 화학적 수준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는 뇌이다. 신체 밖으로부터의 정보는 계속적으로 느낌들을 전달하고 그것을 뇌로 전해 정리된다. 이와 같은 정보에 의해 뇌는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떠한 특정 신호에 기울일 것인지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뇌는 문지기처럼 작용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뇌는 사회적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과 화난 얼굴, 음파, 맛을 느낀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화학적 분자 또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접촉들을 선별하여 다듬기 시작한다. 얼굴의 혈관이 신호를 받게 되면 혈관 벽을 이완시킴으로 혈관에 피가 고이게 된다.
신경신호는 정상적인 경우 심장 박동이 고동치게 된다. 또 사람이 신체기관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 속에서 느낀다면, 여러 사회불안이 신체적 증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2. 관계경험이 부족한 상태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은 관계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들은 순수하게는 말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교제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사람 앞이나 낯선 사람 앞에 나섰을 때 긴장감과 압박감, 부끄러움 등이 미리 나타나 정신적 긴장이 입술을 굳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은 말더듬이의 심리상태와도 유사하다.
이런 아동은 유달리 수줍음을 잘 타는 편인데, 이는 성장시 얌전한 아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회공포증 증상을 갖는다. 사회공포증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시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공포증이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이는 사회공포증이 미국 같은 서구 문화권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안은 서구 문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관련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심리,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나’, ‘내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내가 공격적으로 비치지 않았나’, ‘상대에게 폐가 된 것은 아닌가’ 등 가해 염려적 내용들이 추가돼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3. 부정적 평가 반응의 결과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은 부정적 평가 반응의 결과이다. 아동에게 불안정한 애착 형성은 공포감 유발 원인이 된다. 아동은 대체로 유아기 시절 어머니를 늘 따라다니는 애착 행동을 보인다.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수용적이고 따뜻하게 마주하면, 아동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이룬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지나친 의존이 없어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반면 아동의 애착행동에 어머니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아동의 애착 욕구를 좌절시키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최근 20년간 장기적으로 유아의 불안한 애착유형과 아동 및 아동기 불안장애와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불안한 애착을 보였던 사람 중 28%가 나중에 불안장애를 겪는다. 반면 그렇지 않은 유아들은 13%만 불안장애를 겪었다. 이는 거의 두 배의 비율로, 이들이 주로 보인 불안장애는 분리불안 장애나 과잉불안장애 또는 공포감이었다.
이 연구가 비록 초기 애착과 공포감의 특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애착유형이 공포감 발달에 위험요인임을 알려준다. 아동의 애착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수용적 반응과 거부적 반응을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게 보이면, 아동은 불안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4. 정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을 둔 부모라면, 전술한 원인을 참고해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올바르게 양육을 한다 해도, 반드시 원인이 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
김충렬 박사
전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문의: www.kocpt.com
상담: 02-2202-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