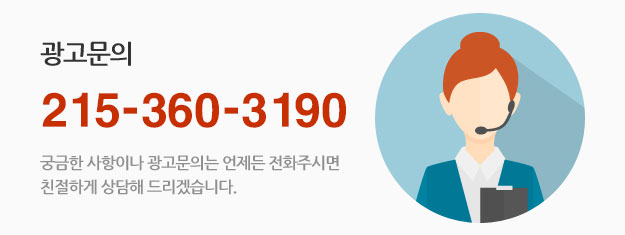개혁신학회 44차 정기 학술대회
삼위일체 용어, 성경에 없지만
교리 전에 성경 핵심이자 시작
아리우스, ‘예수=하나님’ 거부
견해 확산돼 니케아 회의 소집
정통파, ‘동일실체’ 용어 주장
아리우스, 결국 회의에서 정죄

개혁신학회(회장 문병호 교수) 제44차 정기 학술대회가 4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복중앙교회(담임 길성운 목사)에서 ‘신경(信經)과 정통 교리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석환 박사(칼빈대 명예교수)는 ‘니케아 신경 이해의 신학적·역사적 전통’을 주제 발표했다. 이후 세 분과에서 세 차례씩 총 아홉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는 아리우스파 등 이단을 단죄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이후 최초로 열린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채택된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제정 1,700년이 되는 해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뿐 아니라 부활절 날짜 지정 방식 등을 정리했다.
김석환 교수는 “삼위일체는 니케아 신경 작성으로 새롭게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 교부들이 연구하고 논의하기 전 이미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의 핵심이자 교리의 시작이다. 교리의 시작이 삼위일체부터이지만, 교리 이전에 성경 자체라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후 그는 니케아 신경의 형성 과정과 이에 대한 계속된 왜곡 시도, 그리고 이를 바로잡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폈다.

김 교수는 “삼위일체 진리가 확립되기 전인 4세기 초반까지,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마 16:16)에는 크게 공감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도마의 신앙고백(요 20:28)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부활 후 비로소 생겨난 고백이었고, 유일신 사상이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함부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성경 중 이런 몇 구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적 해석을 시도한 사조들 중 아리우스(Arius) 장로의 견해가 가장 위험하면서도 인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아리우스의 견해가 확산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범교회적 종교회의(The First Ecumenical Council)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 전체 감독들의 1/6인 318명이 5개 교구에서 참석해 한 달 반 동안 토론을 계속했다.
회의에서 감독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알렉산더 감독과 그를 보필해 참석한 알렉산드리아 집사장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of Alexandria, 295경-373)와 궁정감독 호시우스(Hosius of Cordova)는 정통 신학을 옹호했고,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는 아리우스파를 옹호했다. 교회사가인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중간 입장에 섰다.
그는 “아리우스파가 먼저 신조를 제출했으나, 감독들이 반발했다. 이에 유세비우스가 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규율’을 낭독했는데, 아리우스파는 그 정도 신조라면 인정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정통파는 아리우스파가 서명할 수 없는 신조를 원했으므로, 두 구절 삽입을 요구했다. 하나는 ‘성자께서 피조된 것이 아니시라(not made)’, 하나는 ‘성부와 성자께서 동일실체(ὁμοούσιος·호모우시아)’라는 구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통파 주장이 채택됐다. 니케아 신경은 한 아버지(ἕνα Θεὸν Πατέρα), 예수 그리스도(ἕνα Κύριον Ιησούν Χριστόν), 성령(τὸ Πνεύμα τὸ ἅγιον)에 대한 신앙, 아나테마(ἀναθεματίζει)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이미 321년 알렉산더 감독에 의해 파문당했던 아리우스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죄됐다.
유사 아리우스파 등장 등 위기
381년까지 12가지 신조 발표돼
‘유사실체’로 기울어지는 추세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소집
유사실체 아닌 ‘동일실체’ 확인
성령 실체 성부 하나님과 동일
김석환 교수는 “그런데 니케아 회의는 4세기 교회의 교리적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삼위일체 논쟁은 더 진지해졌다. 니케아 공회의가 아리안주의를 정죄했지만 그 정죄가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했고, 논쟁은 50년 이상 계속됐다”며 “니케아에 참석했던 감독들 대부분은 니케아 신조에 서명했지만, 신조가 이해된 방식 차이는 광범위했다. 이제 막후에서 격렬한 정치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교수는 “극단적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니케아 신앙의 핵심단어인 ‘동일실체’를 회피하거나, 삼위 하나님의 신적 위격이 등급과 영광에 있어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 아리우스파와 니케아파 간의 대립이 심화됐다”며 “325년 제1차 에큐메니칼 공회의인 니케아 회의부터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에큐메니칼 공회의까지, 최소 12가지 신조들이 만들어졌다. 그 기간 정통 니케아파는 약세를 면치 못했고, ‘동일실체(ὁμοούσια·호모우시아)’가 아닌 타협파의 ‘유사실체(ὁμοιούσιος·호모이우시오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추세였다”고 전했다.
그는 “아타나시우스는 수많은 아리우스주의자들 및 유사 아리우스주의자들과 맞서 홀로 싸웠다. 그러다 ‘유사실체’에서 ‘동일실체’로의 큰 방향 전환이 362년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종교회의에서 있었다”며 “회의 결론은 ‘의미가 동일한 한, 언어의 차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니케아 신조’만 인정하면 다른 미묘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상호 이해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아타나시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이 되신 로고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하나님과의 결합이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381년 5월 동방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1세가 동방 주교들로 구성된 공회의를 콘스탄티노플로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확대된 니케아 신경이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of Salamis, 315-403)에 의해 보고됐고, 몇몇 공식들에 의해 보충작업이 있었다”며 “그러나 삼위일체 관련 교리적 결단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단은 제국 내 모든 이단들의 시도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됐다. 이 공회의는 동방에서 온 참석자들 수에 따라 ‘150명 교부들의 공회의(Concilium 150 Patrum)’라고도 불렸다”고 했다.
그는 “이 공회의에서는 성령의 신성(divinitatem Spiritus Sancti)을 확정했다. 니케아 신경에 포함됐던 아리우스주의 정죄 문구는 삭제했지만, 성부·성자·성령께서 동등 영원하시며(coeternal), 동일실체적(consubstantial)이심이 확연하게 선포됐다”며 “이 회의에서는 삼위일체론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결정됐다는 역사적·신학적 의미가 있다. 유세비우스 후임자 아카키우스(Acacius)에 의해 주장된 타협형으로서의 ‘유사실체’를 물리치고 니케아 회의대로 ‘동일실체’를 재확인한 것, 그래서 성령의 실체(οὐσία)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격으로서의 성령 조항을 보완했다. 이 확장된 고백을 합해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동방교회의 고전적 신경으로서 동방교회의 사도신경에 해당한다”며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과 별개의 독립된 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충했다.
아퀴나스, 형이상학 사변 치중
삼위일체론, 위격 정의 오류도
종교개혁, 세심하게 다시 회복
위격, 하나님의 ‘본질’ 속 실재
한국 신학계, 관련 용어 정리를
본체, 인격 하나님 진술 부적합
김석환 교수는 “중세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형이상학적 사변에 치중한 삼위일체론을 전개했다. 특히 ‘위격’ 정의에 있어 용어상 오류 등으로 오해 가능성이나 오류 섞인 진술들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구원관·교회관 바탕 위에서 성경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론과 삼위일체론의 오묘한 부분에 있어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세심한 작업들이 크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칼빈은 ‘위격(hypostasis)’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다른 위격들과 관련을 가지면서도 각기 어떤 특별한 자질(a special quality)을 가짐에 의해 구별되는 어떤 실재(a subsistence)’라고 정의했다”며 “칼빈은 토마스의 정의를 바로잡아 ‘구별’과 함께 ‘독특한 특성’도 동시에 강조한다. 특히 위격 정의 중 ‘실체(substantia)’ 대신 ‘실재(subsistentia)’를 합당하게 사용했다. 정리하면, 위격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실재(subsistentia in Dei essentia)’”라고 했다.
끝으로 “이처럼 신학 전개에 있어 올바른 용어 선정과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신학계도 신학용어, 특히 삼위일체 관련 용어들을 좀 더 다듬고 정리할 필요성이 미래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며 “한국 신학계에서 개혁교회와 가톨릭, 보수와 진보를 포함해 시급하게 합의할 사항들을 3가지 정도 제안하고자 한다. 이 3가지의 결론 또는 방향뿐 아니라 다른 용어들까지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있기를” 후배 신학자들에게 당부했다.

그의 제안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본체’라는 용어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둘째, ‘발생과 발출’을 쓸 것인가, 아니면 ‘출생과 출래’를 쓸 것인가? 셋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고 해도 옳고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다’고 해도 옳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가?
특히 첫째 문제에 대해 “‘본체(本體)’라는 용어는 박형룡 박사 이래 현재까지 한국 신학계에서 곧잘 사용하는 용어이나, 자칫 사신론(四神論, tetratheism)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외에 별도로 배후에 한 본체께서 따로 계신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체’는 기계 부품(部品)이나 지체(肢體)의 반대 의미가 있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술하는 데 부적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의 번역어로서 ‘본체’는 적절하지 않다. ‘휘포스타시스’는 원래 철학용어로 헬라어 어원적으로 사물의 하부(下部, ὑπό)에 있으면서 그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며 “즉 ‘성부의 위격’으로 번역할 용어가 ‘본체’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그 계기는 불가타역에서 ‘휘포스타시스’를 ‘수브스탄티아(substantia)’로 잘못 번역해 ‘위격’과 ‘실체’가 혼동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문자이다. 특히 한류의 도도한 흐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고, 장차 한국 신학이야말로 전 세계 신학을 이끌 중차대한 사명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의성어와 의태어, 존칭어가 아주 세밀하게 발달한 한국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중하게, 만홀됨 없이 표현할 최적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관련 신학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삼위일체 관련 용어들의 진중한 정리가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